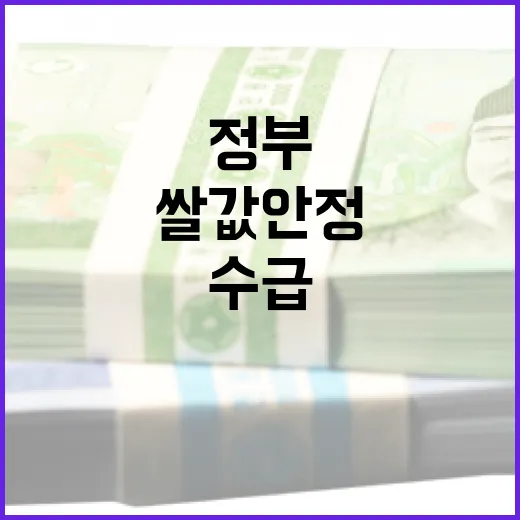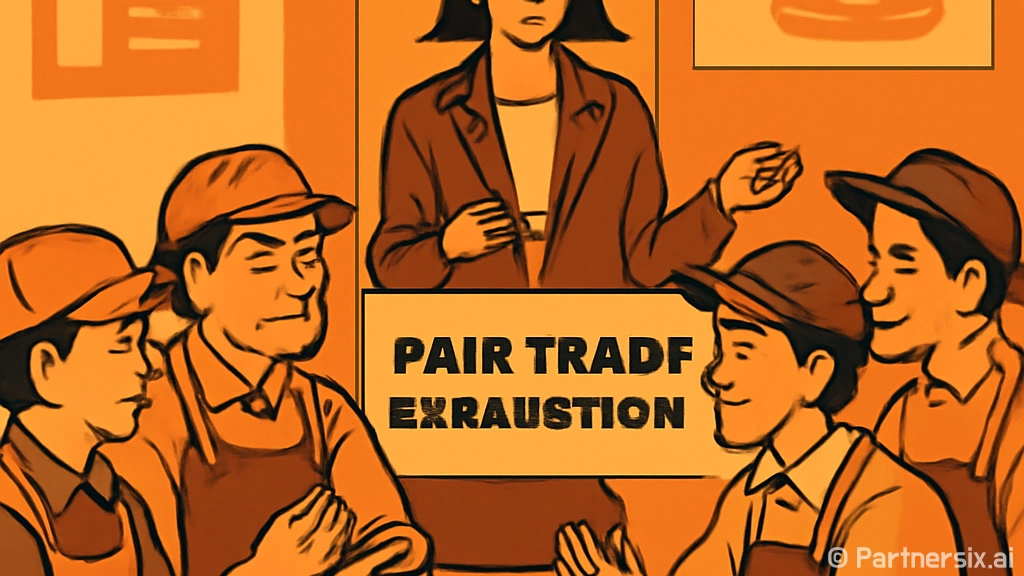쌀값 안정 위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 조치
쌀값 안정 위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 조치
최근 일부 보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연이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일본의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리한 것이며,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의 쌀값 상승은 생산량이나 재고량 부족이 아닌,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중심으로 한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통 흐름과 재고 파악이 용이합니다. 또한 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지 쌀값 동향과 민간 재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 등 가격 급등락이 예상될 때는 선제적인 수급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경연도 일본 쌀값 상승이 생산량 부족보다는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 우려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의 쌀값 급등은 대지진 우려에 따른 사재기와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급증과 유통 흐름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급 상황과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20만 톤 이상의 초과 생산이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시장 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 톤의 쌀을 매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불필요한 시장 격리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올해 정부는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20~25만 톤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5만 헥타르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벼 회귀 면적과 감축 이행률을 고려해 목표를 8만 헥타르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