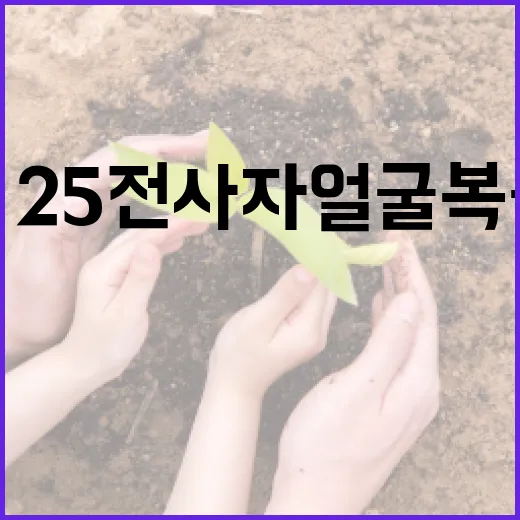6·25 전사자 얼굴 복원, 영정 없는 안장식에 희망

6·25 전사자 얼굴 복원, 영정 없는 안장식에 희망
2025년 5월 8일, 송재숙 씨는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습니다. 6·25전쟁 발발 직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75년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송 일병의 유해가 발굴되었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된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해 생전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전사자들의 얼굴을 재현해 유족에게 영정 사진을 선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이규상 중앙감식소장은 "얼굴 없는 안장식이 안타까워서 유족에게 영정 사진이라도 선물하자는 뜻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2015년부터 발굴된 유해의 감식을 담당하며, 3D 스캐너와 치아 엑스레이 등 정밀 장비를 활용해 유해 정보를 수집하고 유전자 검사용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등으로 참여율이 낮아 현재까지 1만 1469구의 국군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이는 256명에 불과합니다.
얼굴 복원은 발굴된 두개골의 상태가 양호하고 얼굴 특징이 뚜렷한 유해를 선정해 진행합니다. 송영환 일병의 경우 광대뼈가 발달하고 콧대가 살아 있어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컴퓨터 단층촬영(CT)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부 두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얼굴을 재현하며, 눈매와 피부색 등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특징을 살려 20대 초중반의 젊은 시절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얼굴 형태부터 눈썹, 머리카락까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결정하며, 군복과 철모 등도 당시 상황에 맞게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
유해 감식은 발굴된 유해를 세척하고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 구의 유해가 섞여 있을 경우 해부학적 자세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분합니다. 그러나 70년 이상 땅속에 묻혀 토양화가 진행된 유해는 DNA 분석이 어려워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는 신원 확인의 핵심입니다. 전사자의 직계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참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8촌까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먼 친척까지 신원 확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발굴지 조사부터 유전자 분석 재검토까지 신원 확인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매년 두 차례 합동 안장식에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호국원이나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이규상 소장은 "신원이 확인되어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 분이라도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얼굴을 복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영정 없는 안장식에 새로운 의미와 위로를 전하며 유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